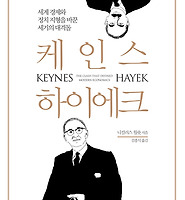Dog君 Blues...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젊은역사학자모임, 역사비평사, 2017.) 본문
1. 책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구구절절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이 책 자체가 고대사를 둘러싼 주요한 쟁점을 효과적으로 꿰뚫고 있는데다가, 이미 수많은 분들에 의해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니까. 나는 그저 보통의 독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하기로.
2. 지리결정론에 대해서 막연한 정도의 이해 밖에 없었다. 옳다 그르다 하는 정도도 아니고, 아,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이해만 있었다. 물론 예전에 ‘총, 균, 쇠’를 읽었을 때 느꼈던 거부감을 생각하면 지리결정론에 마냥 호의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솔까말 가끔 강의 같은 자리에서 ‘대륙’이니 ‘해양’이니, 그 사이에 낀 한반도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클리셰에 꽤 의존했기 때문에 몇몇 부분에서는 나도 몰래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다. 어디서는 유사역사학이 어쩌고 사이비가 저쩌고 욕하고 다녔지만, 나 역시도 아직 돌아볼 것이 많구나 싶다.
다음으로 반도적 성격론이다. 만선사관에 비해 오늘날 보다 뚜렷하게 잔존해 있는 것이 이 논의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제정세나 안보를 논할 때면 “지속적인 외세의 위협에 노출되는 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 혹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반도”와 같은 표현을 꽤 자주 접해왔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반도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 양대 세력의 각축장이 되며, 전쟁과 평화를 비롯한 우리의 운명은 그들의 형세에 따라 결정된다는 숙명론으로 나아간다. 환경결정론적 사고가 지리학에서 기피되는 접근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은 여전하다.
외교나 안보처럼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 않는 자리에서도 반도적 성격론은 유효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리꾼들이 “대륙”, “반도”, “열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방식으로, 이는 지정학적 상상력과 연결되어 있다. 지리적 위치에 특정한 비하와 조롱의 부정적 어감을 부여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이럴 적 “강대국 틈에 낀 반도에 있기 때문에 살기 힘들다”, “반도라는 닫힌 땅에 있어서 개방성이 없다”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한 발언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특정 시기 그러한 때가 있다 해도영구지속적인 것이 아님은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 반도는 무언가 불만이 녹아들 수밖에 없는 지리적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상이다.
이러한 사고는 이웃 국가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으로, 섬나라라는 점을 부각하여 일본사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열도적 성격론’이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편린은 개항기 지식인들이 과거 일본의 미개함을 강조한 것에서도 보이지만, 해방 이후에는 쇼비니즘과 맞물려 한층 강화되었다. “일본인은 섬나라에 살기 때문에 도량이 좁고 성급하며 국민성이 호전적이다”와 같은 말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자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지리적 조건이 그 공동체와 성원의 특징을 결정지은 셈이다.
그런데 실제 열도나 섬나라의 역사는 일각의 선입견과 다른 양상을 봉니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의 역사가 침략 지향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었다는데 동의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항해시기 이전 잉글랜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로마·앵글로색슨족·노르만족의 침입에 시달렸으며, 누차 정복자들의 왕국이 수립되었다. 지리적 조건은 대항해시기 이후와 같음에도 그러하였다. 일본 역시 왜구가 때때로 준동하였을 뿐, 국가권력이 대외적 침략을 실행에 옮긴 것은 임진왜란 정도였다. 통일 전 이탈리아를 보아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것은 시칠리아가 아니라 베네치아였다. 환경결정론적 지리학은 오늘날 가짜 과학(pseudo science)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반도적 성격론 내지 특정 국가에 대한 선입견이 지니는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강진원, 「식민주의 역사학과 ‘우리’ 안의 타율성론」, pp. 49~50.)
일찍이 타율성론(반도적 성격론)을 비판한 이기백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역사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지리적 조건이었다는 이 지리적 결정론이야말로 반도적 성격론이 디디고 서 있는 발판이었다. 그러므로 반도적 성격론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결정론을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리적 결정론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이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 결과는 결국 식민주의 사관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양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 그러므로 식민주의 사관의 극복은 역사관의 근본적인 변혁 자체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넓은 국토를 개척하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야만 위대한 국가가 된다는 낡은 역사관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민족 내부의 문제로 돌려야 한다. 민족 내부에 쌓여 있는 모순을 개혁하여 우리의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킨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넓은 국토를 지난 군사적 강대국, 곧 ‘위대한 고대사’를 말해야 비로소 식민주의 역사학에서 탈피한다는 강고한 믿음이 오히려 식민주의 역사학의 사유일 것이다. 그리고 그 사유는 비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점에서 ‘주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정빈, 「한사군, 과연 롼허강 유역에 있었을까?」, pp. 113~114.)
3. 유사역사학이 근대적 욕망에 발을 디디고 있다고 한다면, 유사역사학을 단지 고대사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도 내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지 모른다. 당장 정훈교육과 유사역사학의 관계라거나 하는 것...
'잡冊나부랭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기호, 문학동네, 2006.) (0) | 2018.03.18 |
|---|---|
| 숫자 없는 경제학 (차현진, 인물과사상사, 2011.) (0) | 2018.03.18 |
|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모리스 마이스너, 이산, 2004.) (0) | 2018.03.12 |
| 케인스 하이에크 (니컬러스 웝숏, 부키, 2014.) (0) | 2018.03.11 |
|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김두얼, 해남, 2017.) (0) | 2018.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