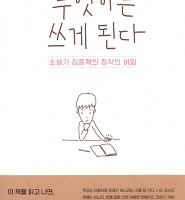Dog君 Blues...
모든 시도는 따뜻할 수밖에 (이내, 소소문고·호랑이출판사, 2017.) 본문
1. 소소책방에서 보내주신 것을 책장에 꽂아만 두다가 2017년이 몇십 시간 안 남았을 때 드디어 책장을 들춰보았다. 판형이 작아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가방에도 잘 들어가며 손에 쥐고 읽어도 손가락이 아프지 않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펼쳐보기에 너무 뻣뻣하다는 단점도 있다.) 이런 책은 대중교통 안에서 읽기에 딱이다. 2018년부터는 대중교통에서는 가급적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결심을 지키기에는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을리가 없지.
2-1. 나는 ‘냉소’야말로 가장 손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니, 거기에 더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의 자존심까지 깔아뭉갤 수 있으니 손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건 나쁜 거다.
2-2. 반대로 뭐든 좋으니 일단 해보자는 태도는 훨씬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수고를 요하는 일인데다가, ‘뭐라도 해보자’는 결심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일단 생각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결심에는 대체로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전제되어 있기 마련이라서, 와아 그것만으로도 벌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 내가 이 책에서 읽어낸 것은 그런 마음이었다. 지금 당장 내 옆의 사람에게 집중하기,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그게 당장 나에게 무슨 이득을 줄지는 일단 생각하지 않기 같은 것들. 지금까지 어줍잖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린 잠정결론 중 하나는,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어디 신문기사에서 ‘선의 평범성’이라는 (멋진!) 표현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그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딱 그것이고.
영화제의 이튿날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좁은 골목에 있는 ‘청년공동체 도꼬마리’에 도착했을 때,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다. 영화는 둘째 치고, 잊지 못할 장면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 어디에선가부터 어둠 속 어딘가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김밥이다. 때마침 영화에서 도시락이 나오는 장면이라 4D 영화인가 했더니, 주성치의 영화답게 콧물이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김밥을 씹게 되었다.
첫날 상영을 해보니 관객들이 배고파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둘째 날 급하게 김밥 배급이 결정되었다고 했다. 유료 상영도 아닌데 관객의 주린 배까지 신경 써 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니, 역시 꼭 참여하고 싶다는 내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날 나는 가장 멀리서 온 관객이 되어 ‘최장거리 관객상’을 수상했다. (pp. 31~32.)
나는 내가 노래를 짓고 부른다는 것이 신기하고, 누군가 내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것은 그보다 더 신기했다. 이런 채로 나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나는 음악가인가?’라는 질문 앞에 섰다. 나 자신을 ‘음악가’라고 불러보자고 처음 결심했던 때가 이 연재를 시작하던 그 시기였다. 지금도 그런 고민이 들 때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대단한 노래를 만드는 것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pp. 188~189.)
4-1. 그런 생각들을 차분하게 읽는 재미 덕분에, 길고 긴 버스/전철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앨범을 주문하러 가볼까나.
4-2. 아 그리고 ㅋㅋㅋ 이건 좀 의외의 발견인데, 나와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다. 뭐라도 글을 쓰려면 카페에 나와야 한다거나(당연히 나 역시 지금 카페에 있다!) 소소책방을 짝사랑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상하게도 혹은 당연하게도, 나는 집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차분하고 조용한 공간보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금은 소란스러운 곳에서 집중이 잘 되어 지하철 안이 최고로 훌륭한 도서관이었고, 다이어리에 계획을 세우거나 일기를 쓰기 위해서도 크고 작은 카페들을 돌아다녔다.
지금 나는 매우 무겁고 커다란 노트북을 짊어지고 나와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어느 정도 소음이 공간을 채우는 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진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길 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노래를 부르는 일들은 내 생에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행복은 자칫 삐끗할 수 있다. (p. 37.)
“밥 먹었어요?”
‘소소책방’ 방주 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진주에서 앨범을 녹음한다고 말하자마자 “그럼 점심 사줄게요” 하셨고, 우리는 진주의 명물(?) ‘엄마국수’에서 국수를 먹었다. 그리고는 전날 잠을 잘 못 자서 낮잠을 잤더니 녹음 전까지 목이 안 풀려 걱정이 되었다. 오늘은 퍼커션 녹음이 없는데도 ‘간장’은 준영 씨가 짐 나르는 걸 도와주러 왔다. 그리곤 피곤했는지 한쪽에서 잠이 들었다. 쌔근쌔근 숨소리가 조금은 녹음되었을 거다. 어제 다원장 님에게 매니저 일을 인수.인계받은 방주 님은 음료와 간식을 챙겨주셨다. 내가 진주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소소책방’에서 녹음이라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 (p. 69.)

ps. 그리고 그냥 마음에 들어서 체크해 둔 구절. '그녀들'이라는 노래의 노랫말을 읽으면서는, 나도 품이 너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ㅎㅎㅎ (궁서체임)
친구들과 ‘생각다방 산책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비스무리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서늘한 관계를 늘 지향해왔다. ‘우리의 관계는 언제든 끝날 수 있으며 너에게 전적으로 자유가 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한다. 그만큼 나에게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있는 그대로 너를 받아들일 테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이런 식의 태도는, 함께 살며 겪게 되는 일상의 자잘한 문제들을 자주 해결해준다. 순간의 사안에만 집중하면 감정적으로 꼬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나는 믿어온 것이다. (p. 95.)
그녀들 / 이내 작사.작곡
몸이 밝은 그녀는
햇볕 아래 빨래를 널고
고양이의 숨은 상처를 살피네
품이 너른 그녀는
고개를 끄덕끄덕
그 사람의 지난 역사를 좇아가네
손이 깊은 그녀는
꽃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마음과 세계를 이해하네
그녀의 몸, 그녀의 품, 그녀의 손,
그녀들
그녀의 시간, 그녀의 눈물, 그녀의 노래,
그녀들 (p. 121.)
'잡冊나부랭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엇이든 쓰게 된다 (김중혁, 위즈덤하우스, 2017.) (0) | 2018.01.14 |
|---|---|
| 신라 탐정 용담 (이문영, 웃는돌고래, 2017.) (0) | 2018.01.12 |
|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볼드, 반비, 2016.) (0) | 2017.12.09 |
| 바깥은 여름 (김애란, 문학동네, 2017.) (0) | 2017.11.21 |
|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부키, 2017.) (0) | 201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