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君 Blues...
알고 있다는 착각 (질리언 테트, 어크로스, 2022.)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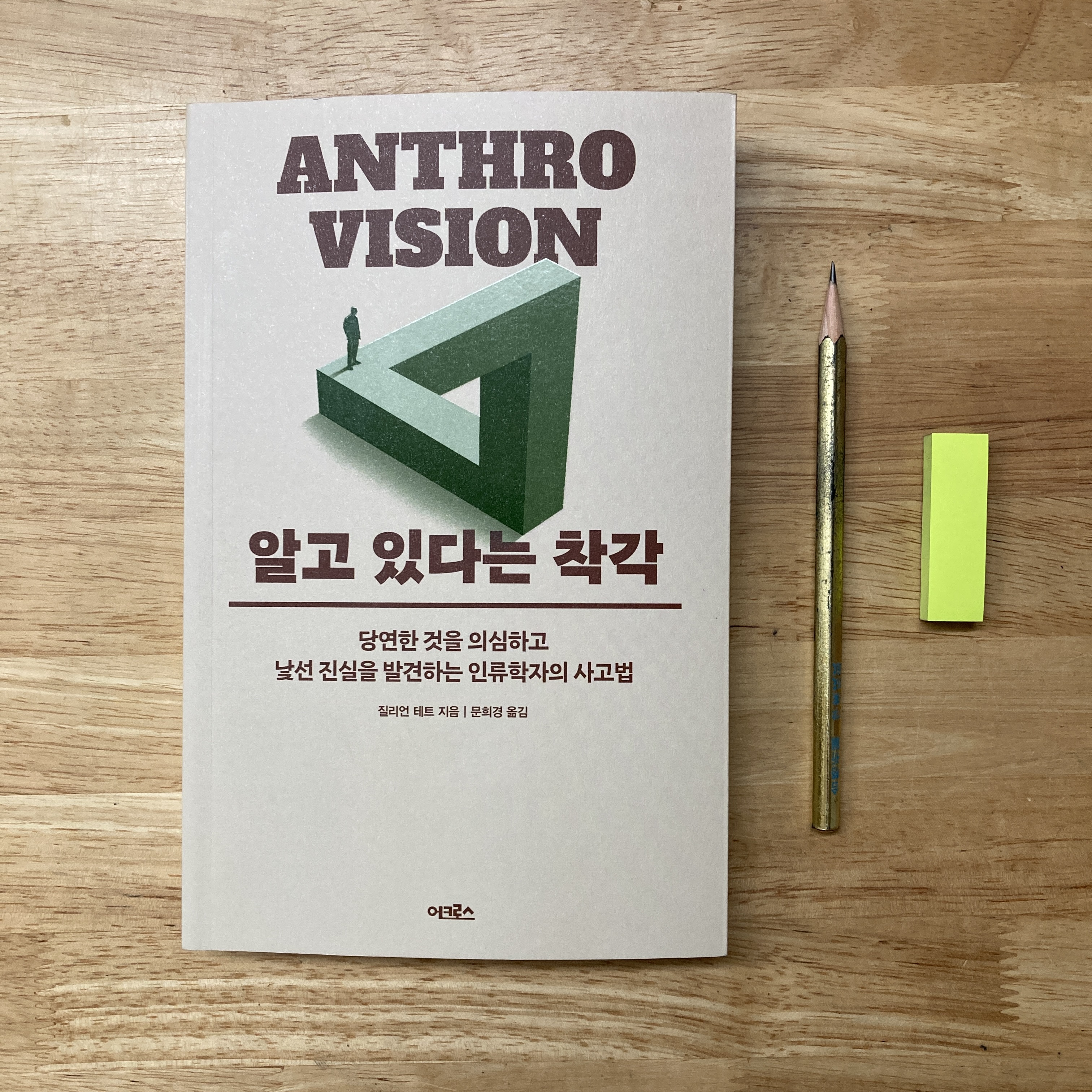
이 책의 목표는 단순하다. (...) 사람들이 '이국적'인 것만 연구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학문에서 나온 개념이 오늘의 세계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나는 이제껏 일하면서 인류학의 용도를 절감했다. 이 책에서 설명하겠지만 나는 타지키스탄을 떠난 뒤 저널리스트가 되어 내가 배운 인류학을 토대로 2008년 금융위기와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 지속 가능성 투자(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옮긴이)의 급증, 디지털 경제 등에 관해 예견하고 이해했다. 한편 이 책에서는 인류학이 어떻게 기업의 경영인, 투자자, 정책 입안자, 경제학자, 기술 전문가, 금융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정말이다)에게 가치 있는(있었던) 학문인지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실제로 인류학의 여러 개념은 아마존 밀림만큼 아마존 창고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하다.
왜일까? 이제껏 우리가 세상을 탐색하는 데 사용한 갖가지 도구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경제 전망이 빗나가고 선거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 금융 모형이 실패하고 기술 혁신이 위험 요인으로 돌변하고 소비자 조사가 현실을 호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도구가 틀렸거나 쓸모가 없어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문제의 기존의 도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런 도구는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되는 데다, 애초에 터널 시야로 만들어지고 세상을 한 가지 매개변수 집합으로 간단히 규정하거나 포착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평온해서 과거가 미래의 좋은 지표가 되는 시대라면 효과적일 수도 있는 도구나. 하지만 지금처럼 유동적인 세계에서는 (...) 효과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딱딱한 경제 모형과 같은 20세기의 도구만으로 21세기를 탐색하는 것은 한밤중에 나침반의 눈금만 읽으면서 어두운 숲을 지나가는 격이다. (...) 터널 시야는 치명적이다. 주변을 둘러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인류학이 전해줄 수 있는 것, 바로 인류학 시야(anthro-vision)가 필요하다. (8~9쪽.)
이것은 무엇보다도 본능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이 책의 요점을 잘 드러낸다. 인류학적 시야의 한 가지 교훈으로, 가끔은 세상을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시대 수많은 지식의 도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미리 방향을 정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경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다. 17세기 유럽에서 출현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탐구법은 관찰의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대개는 먼저 연구하려는 주제나 해결하려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이상적으로는 반복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인류학은 다른 방향을 택한다. 인류학도 먼저 관찰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중요하거나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혹은 주제를 어떻게 분류할지를 사전에 철저히 판단하지 않고, 일단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열심히 듣고 배우려 한다. 그렇다고 인류학자가 개방형 관찰법만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관찰 대상을 이론의 틀에 넣고 일정한 패턴을 찾을 때도 있다. 실증적 방법을 활용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인류학자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넓은 렌즈로 시작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인류학자의 이런 접근법이 대규모 척도로 검증하고 반복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과학자들에게는 거슬릴 수 있다. 인류학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학문으로서 주로 미시적 차원을 들여다보고 거시적 결론을 끌어낸다. 인간은 엄연히 시험관에 든 화학약품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든 데이터와 다르므로 인류학의 심층적이고 개방적인 관찰과 해석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발견하게 될 무언가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그 가치가 더 커질 것이다. (27~28쪽.)
(...) 일부 인류학자는 기업에서 일한다는 개념 자체를 싫어했다. 인텔의 인류학자 케이시 키트너가 인도로 떠난 연구 여행에서 '트립'(가명)이라는 학자와 만난 에피소드가 현실을 보여준다. (...) "트립이 담배를 깊이 빨면서 물었다. '어떻게 인류학자이면서 인텔 같은 데서 일해요?' 키트너는 트립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았다. 기업이 당신의 영혼을 빨아먹지 않냐?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삶을 파는 일이 혐오스럽지 않냐? 자본주의라는 짐승의 배꼽에서 일하면 어떤 기분이냐?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인 조건에서 일할 수 있냐? 신념을 버리는 게 아니냐?" (84~85쪽.)
하지만 지구 반대편 프리타운에 있던 에릭슨은 걱정에 사로잡혔다. 새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데이터과학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벌레의 눈으로 올려다보면 그렇지 않았다. 우선 헬스맵 같은 사이트에서는 영어 뉴스를 추적할 뿐, 아프리카 현지어나 기니에서 쓰는 프랑스어 뉴스조차 추적하지 않았다. 게다가 말라리아용으로 개발된 모델이 에볼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다. 무엇보다도 '핑' 하고 접속 상태를 알리는 안정적인 기지국도 적었다. 결국에는 인텔과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 누구든 (특히 서구의 기술 전문가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같을 거라고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었다. (...) 데이터를 이해하고 싶다면 컴퓨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도 필요하다. (96~97쪽.)
(...) 루스 베네딕트 같은 미국의 인류학자들과 영국 인류학자 E. E. 에반스 프리처드(E. E. Evans-Pritchard)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후 미군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도 인류학자를 활용했다. 다만 이런 사례는 인류학계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인류학자들은 정부의 군사 전략을 도와준다는 개념을 혐오했다. 하지만 오크스는 인도주의적 사명을 안고 일했다고 주장했다. "생명을 구하는 문제였다. 이라크를 생각해보라. 굳이 폭탄을 터트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조 달러를 퍼부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보다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설득을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설득력 있다." (223~224쪽.)
그래서 30년 전 타지키스탄에서 두려움에 떨던 밤(마커스가 내게 인류학이 "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을 때)을 돌아보면 지금의 내 대답은 이렇다. 우리를 둘러싸고 반쯤 감춰진 온갖 위험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류학 시야가 필요하다고. 또 사이버 실크로드와 혁신이 창출하는 흥미로운 기회를 잡아서 번창하려면 인류학 시야가 필요하다고. 인공지능이 삶을 장악하는 시대일수록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찬양해야 한다.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는 공감이 필요하다. 범유행이 우리를 온라인으로 내몬 시대일수록 우리의 물리적이고 '체화된'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봉쇄령으로 시야가 안으로 향하는 시기일수록 렌즈를 넓혀야 한다. 기후변화와 사이버 위험과 범유행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우랫동안 우리를 위협할 것이므로 공통의 인류애를 수용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굳이 '인류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이런 측면을 이해했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310~311쪽.)
교정. 초판 4쇄
57쪽 각주 : 애보리지니(aborinine) -> 애보리지니(aborigine)
113쪽 9줄 : 도미닉 커미스(Dominic Cummings) -> 도미닉 커밍스(Dominic Cummings)
291쪽 13줄 : 뱁척 -> 벱척
'잡冊나부랭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너희는 죽으면 야스쿠니에 간다 (박광홍, 오월의봄, 2022.) (0) | 2022.11.06 |
|---|---|
| 차별의 언어 (장한업, 아날로그, 2018.) (0) | 2022.11.06 |
| 세계사를 바꾼 커피 이야기 (우스이 류이치로, 사람과나무사이, 2022.) (0) | 2022.11.06 |
| 서경식 다시 읽기 (윤석남 외, 연립서가, 2022.) (0) | 2022.10.01 |
| 쇳밥일지 (천현우, 문학동네, 2022.) (0) | 2022.10.01 |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