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君 Blues...
태극기와 한국교회 (홍승표, 이야기books, 2022.)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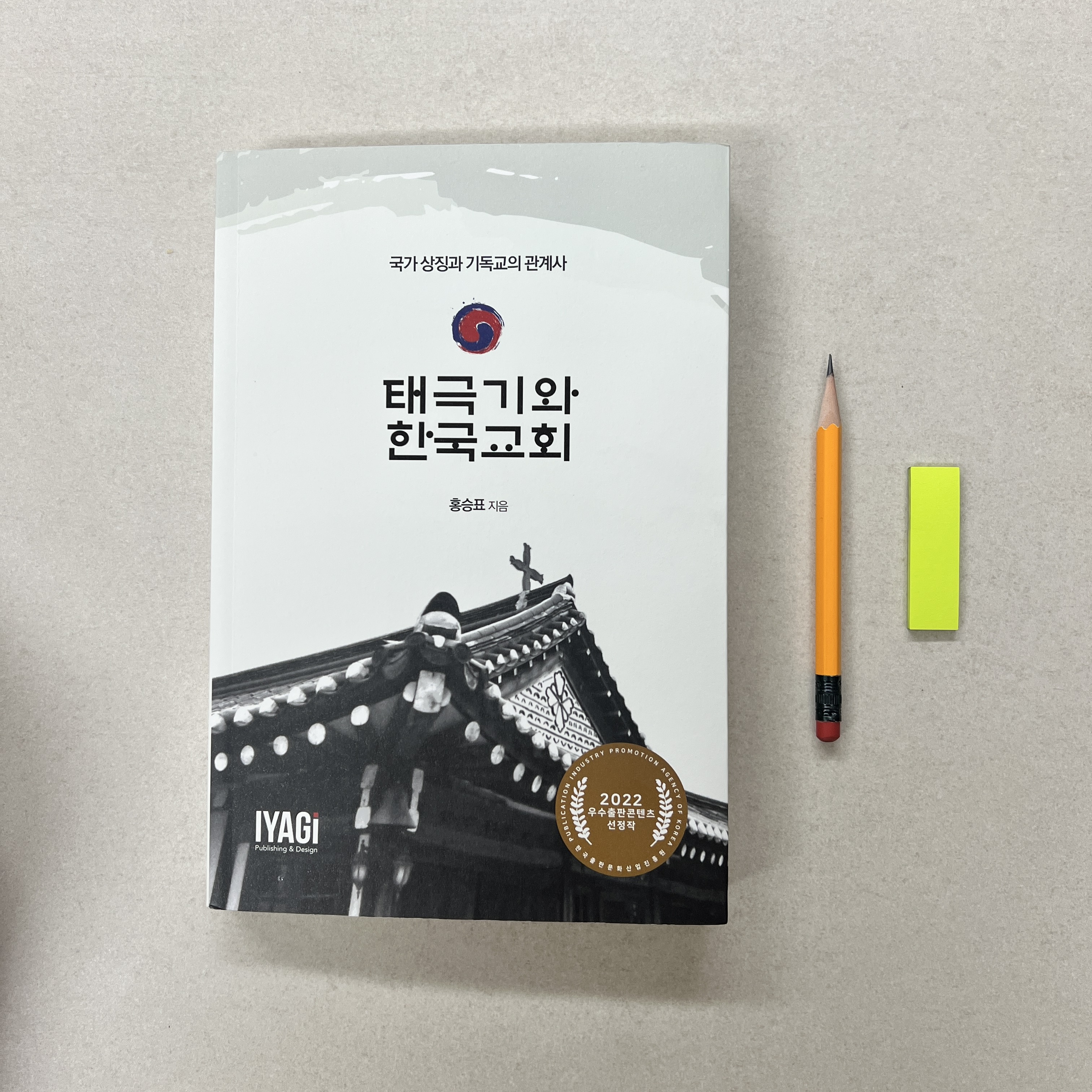
요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한국의 개신교만큼 좋은 소리 못듣는 종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온 사방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의 배후로 개신교가 지목되는데다가, 나쁜 짓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 중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또 왜 그렇게 많으신가요. 이웃한 천주교만 해도 정의구현사제단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경우가 많이 보이니 더욱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태극(기)이라는 국가/민족 상징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과정은 곧 개신교가 조선의 민족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개신교가 타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전광훈이니 태극기부대니 하는 것으로 한국의 개신교가 과잉대표되는 현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는 한국 개신교의 근대사를 통해 타자에 대한 공감과 포용이 한국 개신교의 근본정신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희에게 권해주신 꽃빵님의 의도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싶구요.
비신앙인의 길을 올곧게 걷고 있는 (ㅋㅋ) 저는 이번 책과 녹음을 통해 많은 것을 새삼 배우고 느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비신앙인인 저 역시도 개신교는 왜 전광훈 같은 이들을 단호하게 도려내지 못하는지,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지, 못내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책과 녹음을 통해 그것만으로 개신교에 대한 제 인상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광훈 같은 이들을 꾸짖고 개신교의 자정을 촉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역할을 고민하고 종교의 제자리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분투하는 이들이 여전히 교회공동체 내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방식이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악한 이들을 꾸짖는 것만큼이나 선한 이들을 지지하는 것에도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무슨 언론이고 무슨 단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썩었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내 정의감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곳에서 분투하는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을 도울 방법이 무언지 찾아야겠습니다.
최병헌은 태극 사상의 원리와 그 내용의 탁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태극의 원리를 주관하는 주체 혹은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태극의 이치는 누가 만들었으며, 음양의 기운이 어디서 왔는지" 동양 선현들의 수많은 설명과 주석들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태극 사상에 대한 유구한 설명에는 "영동활발靈動活潑하는 권능"이 부재하며, 결국 태극은 "가련한 물건"에 불과하다는 다소 냉소적인 비판을 가한다. (...) (58~59쪽.)
최병헌이 앞서 발표한 "만물의 근본"(1897)에서는 태극을 "가련한 물건"이라 폄하하며 평가한 것에 비해 『셩산명경』의 신천옹(최병헌)은 태극을 "실상 이치뿐"이라는 비교적 중립적·객관적 표현으로 변화한 점이 눈에 띈다. 어쨌든 최병헌은 태극이 감정과 의지가 없는 피조 세계의 원리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태극에서 나온다는 건곤이기乾坤理氣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실제적 창조주가 별도로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병헌은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 또한 피조물의 하나일뿐, 그것이 창조주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원시 유교의 경전에서 등장하는 '상제'上帝는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64쪽.)
세계 교회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니는 차별성과 특징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통해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표현하고 실천했다는 점이다. 서구 제국주의 팽창 과정에서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고 변증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있었다. 아울러 기독교 신앙을 수용하는 피식민지민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민족과 조국을 배신해야 하는 모순과 딜레마에 봉착해야만 했다. 애초에 유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적 보편성과 구원의 이상을 표방한 기독교 신앙이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및 '민족주의'와 뒤엉켜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민족주의의 배타성을 대변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 식민지 경험을 공유한 지역과 국가 중에서 유례없이 제국주의 침략국과 기독교 선교국이 분리되어 들어온 공간이 바로 한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콘텍스트 속에서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일이 곧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역사적 신앙고백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은 한국의 민족성 혹은 민족적 상징체계를 자연스럽게 수용, 내재화할 수 있었다. 소위 '민족교회'라는 개념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토대가 19세기 말 한반도에서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사적 배경 외에도 한국 개신교 내에 민족주의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개신교보다 100여 년 앞서 수용된 가톨릭의 존재였다. 19세기를 시작하며 구한말 조선의 국가권력과 충돌하며 숱한 박해를 경험한 가톨릭과의 선교 경쟁은 개신교에 가톨릭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도록 요구했다.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종교, 반국가·반민족 집단으로 치부되어 온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조선의 정부와 백성을 존중하고 이로운 종교,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체선언"異體宣言을 통해 19세기 말 당시 가톨릭이 교회 중심적 선교에 머물러 있던 것과 달리 "병원-교회-학교"라는 트라이앵글 선교 방식을 구사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아울러 개신교는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종교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 개신교는 청일전쟁(1894), 을미사변(1895), 아관파천(1896), 독립협회 창설(1896), 대한제국 선포(1897)가 숨 가쁘게 전개된 격변기를 거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충군애국"적 교회로의 길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68~70쪽.)
이러한 개신교의 행보는 당시 조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독자적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선교 정책을 펼치던 가톨릭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내한 선교사들과 개신교 신자들의 적극적 정치 행보에 대해 당시 한국에서 활동한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1854~1933) 주교는 (...)
(...) 개신교인들의 대한제국 황제를 향한 열성적인 충성과 애국활동에 대해 비교적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예년보다 요란스럽다"는 표현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는 자의식이 느껴진다. (...) (94~95쪽.)
국권이 피탈되어 가는 시기에, 교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로 흘러들어 오는 이들을 경계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종교적 각성과 회개 운동을 통해 이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거나 신앙 체험으로 정치적 울분을 극복하도록 이끌기도 했다. 비록 한반도의 망국과 전환기에 교회는 비정치화와 종교적 심연으로 침잠했지만, 태극기라는 국가 상징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국권피탈이라는 슬픔과 절망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신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모색했다. (132쪽.)
(...) 이순화와 김성도라는 신비적 계시 신앙의 역사적 노정에서 배태된 한국 기독교계의 신흥종교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 이후의 새 메시아의 시대"를 천명하며, "그러한 역사가 성취될 땅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세계인식을 공유한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굴절된 민족주의와 동양종교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근대화와 식민지, 전쟁이라는 혼란기의 역사적 콘텍스트 하에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던 민중의 영혼 속으로 빠르게 파급되어 갔다.
이순화의 정도교나 김성도의 성주교는 해방 이전까지도 항일적인 면모를 보이며 나름 민족주의적인 가치와 기독교 신앙을 조합하고자 모색했다. 하지만 그 후예들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상이한 신흥종교 분파들은 영적 투쟁의 대상이 상실된 해방정국과 분단 체제하에서 그 민족적 정체성은 교리적 차원에서의 선언으로만 전락한 채 통일교의 문선명, 천부교의 박태선, 동방교의 노광공, 세계일가공회의 양도천, 새마을전도회(천국복음전도회)의 구인회, 대한기독교천도관의 천옥찬, 만교통화교(에덴문화연구원)의 김민석, 영생교의 조희성, JMS의 정명석, 신천지의 이만희로 이어지는 변이와 진화 과정 속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내적 교조화에 함몰되어 갔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개 교주가 한반도에 도래한 새로운 메시아이며, 민족적 가치와 태극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문선명, 양도천, 구인회, 천옥찬, 김민석 등은 태극 문양을 종교적 행위와 상징, 교리 등에 적극 활용해 포교했다. (267~268쪽.)
손양원 목사는 곧 도래할 대한민국 신생 정부의 미숙하고 어슬픈 국가주의의 전횡과 강요가 눈에 선연히 그려졌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준엄하게 경고하는 태극기에 대한 우상화의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되었다. 그 자신도 한국인이기에 태극기에 대한 애정을 부인하지 않으나 절하는 행위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었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의 경고와 함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때는 가까워 오고 있었다. (288쪽.)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기독교 연합회는 국기가 우상이 아닌 것은 인정하지만, 우상화할 우려가 있음을 강하게 피력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는 〈국기배례 문제애 대하야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천명함〉이라는 8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간행해 적극적인 입장을 펼쳤으며, 1949년 10월 20일에는 안호상 문교부장관의 반反기독교적 문교정책을 조사하는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의 국기 우상화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는 1950년 3월 국기배례를 주목례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공개청원서("경애하옵는 이 대통령 각하")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일제의 '일장기 배례'와 유사한 형태의 '태극기 배례' 의식은 기독교적 규범과 신앙 양심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우상숭배로 인식되어 당시 친기독교적 성격을 지녔던 이승만 정부로부터 '배례'拜禮를 '주목례'注目禮로 전환하는 역사적 변화를 이끌었다. (293쪽.)
교정. 초판 1쇄
124쪽 밑에서3줄 : 미국인 내한 선교사들이 -> 미국인 선교사들이
182쪽 9줄 : 3·1운동의 결과로 전환된 일제의 문화 통치는 1910년 이후 거의 10년간 금기시되었던 태극기의 제작과 게양은 여전히 금기시되었지만, 태극 문양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용인되었다. -> (비문)
208쪽 7줄 : 소昭和 -> 소화昭和
231쪽 6줄 : 제한했다 -> 제안했다
238쪽 밑에서4줄 : 기독교 자를 -> 기독교 신자를
293쪽 3줄 : 한국기독교연합회은 -> 한국기독교연합회는
320쪽 두번째사진캡션 : 하와인 -> 하와이
'잡冊나부랭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계사를 만든 30개 수도 이야기 (김동섭, 미래의창, 2024.) (0) | 2025.02.12 |
|---|---|
| 조선은 청제국에 무엇이었나 (왕위안충, 너머북스, 2024.) (0) | 2025.01.23 |
|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2017.) (0) | 2025.01.01 |
| 한국 사회과학의 기원 (홍정완, 역사비평사, 2021.) (1) | 2024.12.31 |
| 대구 (마크 쿨란스키, 알에이치코리아, 2024.) (0) | 2024.12.29 |





